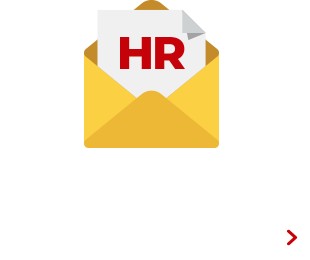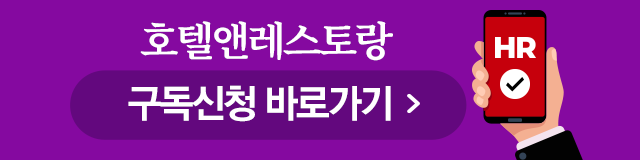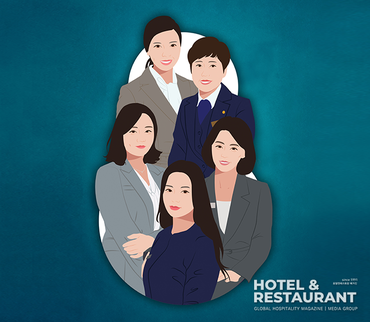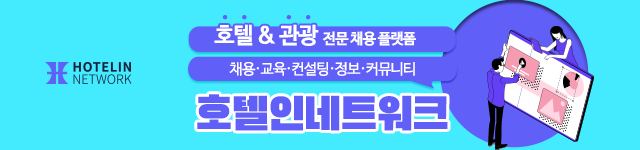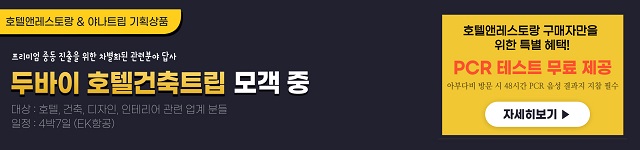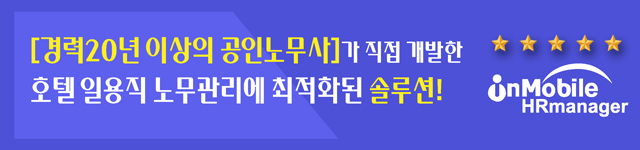치즈의 시초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역사가들은 치즈의 기원을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00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당시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양을 가축으로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기도 하다. 이들은 초목을 찾아 이동하면서 양의 위로 만든 주머니에 양젖을 담아두곤 했다. 그러다 우연히 양젖이 응고된 것을 발견하고 이유 찾아보니 양의 위 점막에 있던 천연 응유효소(凝乳酵素)인 레닌(Rennin)의 영향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발견한 덩어리가 바로 비숙성(Frech) 치즈이자 인류의 첫 치즈였다고 한다.
우유(牛乳)로 만들어진 치즈는 한참 뒤인 기원전 7000~8000년 경이나 돼서다. 우리나라에는 1957년 임실군에 부임한 벨기에인 Didier t'Serstevens(한국명: 지정환) 신부의 도움으로 1967년부터 치즈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사진 제공_ 한국조리박물관

1954년 한국 최초의 피자
치즈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양 음식 중 하나인 피자는 우리나라 의 빈대떡과 비슷한 음식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옛날부터 피자에 사용하는 얇은 빵을 그리스어로 ‘Pitta’라 해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남부지역 일대에서 많이 먹었다. 그러다가 빵 위에 각 지역의 특산물을 얹어 먹게 된 것이 피자의 유래라고 전해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르게리타 피자(Pizza Margreita)는 1889년 나폴리를 방문한 움베르토 1세와 마르게리타 왕비에게 바칠 음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탈리아 국기의 색을 본떠 얇은 빵 위에 빨간 토마토, 흰 모차렐라 치즈, 초록색 바질을 얹어 여왕에게 바친 데서 유래됐다. 피자 커터는 피자의 치즈와 빵의 특징을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피자를 자를 때 빵 부분이 얇으면 칼이 좋지만 요즘 피자에는 2가지 이상 치즈를 섞는 것이 유행이기도 하고, 빵 위에 토핑이 많으면 롤러형 커터가 좋다.
한국에서 처음 피자를 만든 조리사로는 백인수 원로 셰프님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백인수 원로 셰프님이 활동하던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들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줬다고 한다. 1954년 미군부대에서 만든 한국 최초의 피자 탄생 비밀은 소개해보면 재미있다. 반죽은 바케트 빵으로 준비한 다음 파이 팬(Pie Pan)에 얇게 펴고 그 위에 토마토케첩적당히 뿌린다. 케첩 위에 깡통 통조림 토마토를 다져서 물기 빼고 놓는다. 그 위에 매운 타바스코 소스를 뿌리고 마지막에는 스위스 치즈를 덮고, 그 위에 올리브와 양파 썬 것, 살라미를 올린다. 파마산을 뿌리고 버터를 군데군데 놓은 후에 오븐에 굽는다. 피자의 색이 나면 꺼내서 즉석에서 칼로 적당히 커트한 것을 미군 장교들에게 주면 모두들 “원더풀!”하면서 좋아했다고 백인수 원로 셰프님이 회상한 글을 보았다. 내가 생각해봐도 전쟁 중에 내 나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행운인 것이다.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를 먹는 기분이 당시 미군들이 피자를 맛보던 기분과 같지 않을까?

토마토소스
피자에는 토마토소스도 중요하다. 이 소스는 우리가 먹는 스파게티 소스와 비슷하다. 토마토는 Love Apple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채소다. 예전에 이탈리아 셰프를 만났는데 자기들은 하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첫째가 토마토이고 두번째가 올리브 세 번째가 태양이라는 것이다.
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본적인 소스 중의 하나다. 이탈리아 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소스면서 파스타와 피자뿐만 아니라 육류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토마토 가공식품을 잘 이용하면 육류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고 손쉽게 색다른 요리의 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스와 궁합이 맞는 향신료는 바질, 오레가노, 월계수등이 있다. 1692년에는 이미 토마토소스가 개발돼 사용됐다(다치바나 미노리 2003). 최초의 토마토소스 레시피는 1692년 Antonio Latini 가 나폴리에서 출판한 ‘La calco alla moderna’라는 요리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잘 익은 토마토 5개를 불에 그을려 껍질을 벗기고 잘게 자른 후 다진 양파와 고추, 타임을 적당히 넣는다. 여기에 소금, 올리브유, 식초를 넣고 섞어 만든다.”라고 기록돼 있다. 토마토소스를 만들 때 두께가 두꺼운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토마토가 함유하고 있는 다량의 산과 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피자에서 모차렐라 치즈 외에 유명한 치즈로는 파마산 치즈라고 불리는 파마지아노 레지아노(Parmigiano-Reggiano)일 것이다. 이 치즈는 대표적인 경질 치즈(Hard Cheese) 중 하나로 요리에 이 치즈를 사용하려면 곱게 갈아야 쓸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치즈 그레이터다. 유럽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도구며 딱딱한 그뤼에르(Gruyere), 초경질 치즈인 그라나 파다노(Grana Padano) 등 칼로도 썰기 힘든 치즈들은 갈아서 요리에사용한다.
셰프, 다양한 경험 필요해
필자는 1983년 파리에 가니 그곳에서는 치즈만 파는 가게가 있는 걸 보고 놀랐다. 크기도 다양해 책에서만 보던 타이어만 한 치즈에서부터 곰팡이로 감싼 파란 치즈까지 각양각색의 치즈들이 모여 있었다. 이때 딱딱한 치즈를 보고 치즈 그레이터의 필요성을 느꼈다.
1975년에 대학을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외국인 셰프 교수들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다. 졸업 후 호텔에 가보니 조금 이해가 됐고, 주방장이 되고 보니 ‘치즈 그레이터’ 같은 다양한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요령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
그래서 셰프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한 달간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입양된 청년(피에르 상 보이에, Pierre Sang Boyer)이 운영하는 성공한 식당을 방문했다. 오픈 주방에서 두 명의 셰프가 10명쯤 되는 손님을 접대하는 걸 보고 놀랐다. 일식당에서 초밥을 만들어 주면서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메뉴 중에 스파게티가 나올 때에는 즉석에서 치즈를 갈아 주는 것을 보고 젊은 셰프들이 더 멋있어 보였다. 신선한 치즈를 손님 보는 앞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니 셰프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인지 음식의 맛 또한 더 좋게 느껴졌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손님앞에서 샐러드에 치즈 그레이터로 치즈를 직접 갈아주는 곳이 생겨 우리의 음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5대 식품 중 하나가 치즈일 정도로 대중적인 식품이다. 그러니 치즈 관련 요리도 많고 치즈 관련 조리도구와 기구들도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의 요리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려면 다양한 식재료 개발과 함께 조리도구와 기구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수근 최수근한국조리박물관장/음식평론가 하얏트, 호텔신라에서 셰프를 역임했고, 영남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 2021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교수로 정년했다. 현재 한국조리박물관장과 음식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
- 4월 3일~5월 9일 대회·공모전 한국관광공사ㆍ(주)카카오,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 2023.11.30.(목) 대회·공모전 제주감귤박람회, ‘감귤 칵테일 경연대회’ 개최...30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야외 무대에서 본선 진행
- 2023.11.01.(수) 09:00~17:00 컨퍼런스·세미나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트래블테크 네트워킹 지원하는 2023 「K-Travel Tech Summit」개최
- 2023.09.19.(화)~2023.09.21.(목) 축제 관광스타트업·지자체·여행업계가 함께하는 협업의 장,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최
- 2023.10.06.(금)~2023.12.08.(금) 교육과정 현장 시음중심의 최고급 와인 교육, 연성대학교 와인CEO 과정 4기 개설
-

한국관광공사, ‘2024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공모
- 2024-04-15
- 안수진 기자
-

‘디저트 뷔페 명소’ 서울드래곤시티, ‘트로피컬 시티’ 론칭
- 2024-04-15
- 안수진 기자
-

佛 미쉐린 3스타 셰프팀 직접 출격...시그니엘 서울, 야닉 알레노 내한 기념 스페셜 디너 운영
- 2024-04-15
- 안수진 기자
-

위례 특급 밀리토피아호텔, 'SOUND OF SPRING' 갈라디너 개최
- 2024-04-15
- 서현진 기자
-

[Vision 2024] 2024 전국 주요 4성 호텔 경영 전략 및 비전 下
- 2024-04-15
- 서현진 기자
-

<미쉐린 가이드>, 베트남 다낭으로 영역 확장
- 2024-04-15
-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