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점에 광명이 있다. 수많은 전철이 내달리고, 도시 개발의 손길이 꾸준히 스며들고 있지만 이 도시는 아직도 ‘사람’의 감촉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명에서 자란 시인 기형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놓인다. 그의 시처럼 정제되고 서정적인 도시를 걷다 보면 광명에서 보내는 하루가 한 편의 산문시가 된다.
광명의 일상적 유산 - 시장과 식당
광명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보다는 일상의 고정밀도가 중심이 되는 도시다. 일상이 압축된 풍경은 광명전통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곳은 단지 물건과 식재료를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다. 오래된 식당과 애정받는 가게들이 ‘오래 사는 법’을 보여주는 생의 전시장이자, 광명 주민들의 정서적 기반이다.

‘양평해장국’은 그중에서도 유난히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다. 1980년대부터 문을 열어 40년 가까이 광명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다. 국물은 진하지만 과하지 않고, 선지와 내장, 우거지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이 식당은 단지 국밥 한 그릇을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벽을 견디게 했던 기억의 지점을 지키고 있다. 아침부터 줄을 서는 손님들은 그저 배고픈 이들이 아니다. 이곳의 국밥은 그들에게 하루의 리듬을 알려주는 시작의 의식이 되기도 한다.
시장 중심부로 들어가면,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홍두깨손칼국수’가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볼 수 없는 면발의 굵기와 엉성한 듯 투박한 국물 맛. 이 집의 강점은 투박함에 있다. 이런 투박함이야말로 가게를 30년 넘게 유지시킨 힘이다. 단골들은 이곳을 두고 ‘맛을 넘어선 어떠한 정서’라고 말한다.

시장 한쪽에는 ‘광명할머니 빈대떡’이 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의 소리와 향은 늘 비슷한 시간대에 돌아온다. 이 가게의 빈대떡은 담백하고 얇게 부쳐내 고소한 여운이 특히나 길다. 대체 불가능한 맛은 늘 광명할머니 빈대떡을 찾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곳은 ‘새서울정육식당’이다.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등심과 갈비살, 항정살을 정직한 가격과 품질로 내놓는다. 새벽에 도축된 고기가 낮에는 손님의 불판 위로 오르는 구조는 빠르고 투명한 흐름으로 신뢰를 얻었다. 동네 주민들이 회식이나 손님 접대에 애용하는 단골 공간으로 기능한다.

폐광, 동굴, 그리고 도시의 기억
광명이라는 이름에는 묘한 이중성이 있다. 도시 이름은 ‘빛’을 뜻하지만, 그 내부에는 ‘광명동굴’이라는 어둠의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강제 노역이 자행됐던 이 동굴은 1970년대 중반 폐광됐고 이후 오랫동안 잊혔다.
2010년대에 들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이곳은 이제 와인 동굴, 미디어아트 전시, 공포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종합 체험 공간이 됐다. 그러나 이 공간의 진짜 가치는 그 화려한 재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폐광의 어둠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위에 조심스레 빛을 얹은 방식에 있다. 산업화의 폐허 위에 문화적 층위를 더하는 과정은 도시가 스스로의 어두운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다. 그 의미에서 광명동굴은 단순한 관광지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억의 장소다.

서원과 산, 도시의 호흡을 따라 걷다
광명은 단지 식도락의 도시가 아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생활 동선에서 벗어나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고요한 명상 같은 공간들이 있다. ‘충현서원’은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이름난 이원익을 기리는 공간이다. 마당을 지나 고직사 앞에 앉아 있으면, 과거의 시간이 비단처럼 느리게 흐르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아무 말 없이 사유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인근의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은 광명의 숨통 같은 곳이다. 200m 남짓한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서울과 안양, 광명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는 기형도의 시 「입 속의 검은 잎」 속 한 구절이 떠오를 만큼 바람이 차고 맑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썼지만, 이곳에서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어떤 도시의 얼굴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시인의 도시, 사람의 도시
기형도는 광명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시는 광명의 기후와 풍경, 사람의 말씨를 통해 여전히 살아 있다. 이 도시는 격렬하게 변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문학의 토양이 돼준다.
광명은 식도락과 문학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다. 그 안에는 시간을 지키는 방식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으며, 문학이 살아갈 공간이 있다. 이런 도시에서의 한 끼는 식사기 이전에 경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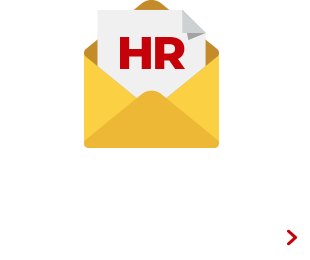



![[it Item] 종합주방 전문기업 '호시자키', 프리미엄 탄산 디스펜서 & 전자동 생맥주 디스펜서 제공](https://cdn.hotelrestaurant.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20888_68265_1947_1762413590_100.jpg)


